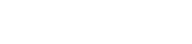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칼럼] 최한별의 못다 한 이야기

-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
중학교 때 열정 넘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다. 팝송 가사를 이용해서 영어 문법과 표현을 알려주셨다. 수업이 지루해질 때쯤, 짬짬이 보여주시는 해외 뮤직비디오 덕분에 우리 반은 리키 마틴 파와 엔싱크 파로 나뉘었고, 나는 아론 카터를 좋아하는 소수파였다. 쉬는 시간이며 점심시간마다 누구의 뮤직비디오를 볼 것인지, 우리반은 늘 시끄러웠다. 그러나 이 분열을 곧 대통합으로 이끈 이가 있었으니…
그날 선생님이 틀어준 뮤직비디오가 시작되자 우리는 웃음부터 터뜨렸다. 수업 종 치기만을 기다리며 삐딱하게 책상 위에 누워있는 한 여자애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와하하, 꼭 우리 같잖아! 그러나 웃음을 터뜨리던 우리는 곧 입을 헤 벌린 채 뮤직비디오에 빠져들었다. 춤 동작에 묻어나는 당당하고 자유로운 태도, 담백한 것 같으면서도 귀에 찰싹 달라붙는 보컬에 다채로운 음악 구성, 분명 서양 사람인데 묘하게 친근하고 귀여운 인상까지. 우리 반은 ‘베이비 원 모어 타임(...Baby one more time)’ 뮤직비디오를 보며 말 그대로 ‘사랑’에 빠졌다. 뮤직비디오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원 모어 타임(한 번 더)!”을 외쳤다. 그렇게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우리반을 정복했다. 간혹 리키 마틴 파와 엔싱크 파가 쉬는 시간의 BGM 쟁탈권을 두고 다투었으나 “야, 그냥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보자” 한 마디면 분쟁은 끝이었고 우린 모두 행복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베이비 원 모어 타임(…Baby One More Time)’, ‘웁스, 아이 디드 잇 어게인(Oops, I did it again)’, ‘크레이지(Crazy)’, ‘스트롱거(Stronger)’, ‘에브리타임(Everytime)’ 등 제목만 읽어도 머릿속에서 노래가 자동 재생되는 사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앨범을 내는 족족 전 세계인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그렇게 2000년대 팝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고?
지난 2월부터, 한동안 잊고 지냈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SNS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발단은 ‘프레이밍 브리트니(Framing Britney)’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다. 다큐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3년간 아버지의 후견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자기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박탈당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전 세계가 ‘옆집 소녀처럼 친근한(Girl next door)’, 그러면서도 ‘건강하고 자기주도적인’ 그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동안, 그는 사생활 침해, 과도한 노동, 재생산권 박탈, 강제 정신과 치료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어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2021년 6월 23일(현지시각), 후견인인 아버지로부터 13년간 ‘착취당했다’며 그의 후견인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피어스의 증언에 따르면, 후견인인 아버지로부터 매주 용돈을 받아 사용하며 살아왔고, 누구와 사귈지, 부엌 수납장 색은 무엇으로 할지, 탄산음료는 몇 잔까지 마실지, 심지어 자궁 내 피임 기구 제거를 해도 되는지까지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야 했다.
브리트니의 팬들은 #FreeBriteny(#프리브리트니, 브리트니를 해방하라) 운동을 시작했다.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후견인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도 뜨겁게 불타올랐다. 해외 장애인권 단체들은 #프리브리트니 운동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하며, 후견인 제도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후견인 제도는 장애계에서 새삼스럽지 않다.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심신 미약’을 이유로 후견인 제도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후견인 문제는 수백만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짚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는 혼자가 아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수백만 명의 지적/정신장애인들이 법적 권한을 박탈당하고, 다양한 유형의 후견인 제도 아래 놓여있다”며 “스피어스처럼, 후견제도는 결국 다양한 형태의 학대―강제 치료, 강제 피임, 강제 임신중절, 비자발적 감금, 강제된 삶의 방식, 이동 제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헝가리를 직권조사한 후, 헝가리 정부가 장애인의 후견인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법적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가 중대하고 체계적으로 위반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헝가리에서) 지적 또는 정신장애인은 실질적이고 예견된 ‘정신 능력’ 약화를 근거로 피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시설 입소도 허용되고 있어 법적으로 직접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후견인을 지정받고 시설에도 입소하게 되면, 두 제도의 결합으로 인해 이들의 취약성은 증폭되고, 사회로부터의 분리와 고립이 영속화된다”고 지적했다.
법적 권한 행사 제한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참정권 제한이 있다. 지난 8월 3일, 한국장애포럼은 유럽의 발달장애인과 가족 권익옹호단체인 ‘인클루전 유럽’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헬렌 포탈 정책 담당관을 통해 아직도 유럽연합 내 12개 회원국에서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U 의회를 구성하는 투표에서도 회원국별 투표권 행사 집단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국적의 발달장애인은 EU 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헝가리 국적인 경우―높은 확률로 피후견인인― 발달장애인은 불가능하다. 헬렌은 유럽 내에서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브리트니에게 자유를, 그리고 수백만 장애인에게도!
후견인 제도는 그 자체가 ‘장애차별(ablism)’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권 활동가인 s.e.스미스(s.e.smith)는 후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장애인법에는 “장애인은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라며 이러한 연장선에서 후견제도가 장애인의 시민권(참정권이나 사유재산권 등) 행사를 박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후견인 제도가 시설에 수용된 유색인종 여성이나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불임수술을 강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등 우생학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우생학적 맥락에서 ‘비정상’들에게는 임신·출산 금지가 강요되어왔다. 스미스는 “브리트니가 임신·출산을 원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자궁 내 피임기구를 제거하지 못한 것 역시 이러한 우생학적 과거의 연장선에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프리브리트니 운동은 ‘브리트니는 미치지 않았다’, ‘브리트니는 정상이다’라는 주장으로는 결코 완결될 수 없다. 후견인 제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건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건 주체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집단을 지정하고, ‘곧고 바른’ 정신을 가진 ‘상식적인 시민’이 이들의 선택을 대신해줘야 한다는 차별적 인식을 기반으로 운용 형태만 달라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리트니가 드러낸 후견인 제도의 비인권적 본질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후견인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을 인권의 주체, 혹은 공동체의 동료 일원에서 배제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미국의 ‘자폐인권익옹호네트워크(Autistic Self Advocacy Network)’의 법률 국장 샘 크레인(Sam Crane)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후견인 제도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드러낸 분노와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향한 지지에 굉장히 감격했다”며 “이제는 사람들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더 이상 누구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더 넓은 차원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항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행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발표하는데, 위원회가 제일 첫 번째 일반논평으로 내놓은 조항이 바로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이다. 위원회는 후견인 제도(guardianship)나 재산 관리자 제도(conservatorship), 정신질환치료법 등과 같은 대리의사결정(substitute decision-making)이 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의 철폐를 촉구했다. 그리고 장애인이 자신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의지 및 선택의 존중을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를 권고했다.
‘법 앞의 평등’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러나 ‘안전과 보호’를 구실로 타인의 삶을 통제하는 모습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과연 이 ‘안전과 보호’가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시도와 실패의 축적을 통해 삶을 누릴 권리를 박탈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부여되지 않았다.
최한별의 못다 한 이야기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국내외 장애계를 연결하는 단단한 다리가 되고 싶어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 KDF)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계 국제 연대 활동을 하며 못다 한 말을 여기에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