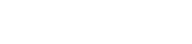네가 해내려 했던 그 꿈을 이 누나가 함께 이루려 하마.
동/민/아!
내 동생 같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던 그 이름인데,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할 수가 없는 곳에 있구나. 동/민/아.
이제 내 목소리로 네 이름을 아무리 크게 불러도 넌 대답할 수가 없지. 이 누나인 나는 널 생각하면 한 가지 영상이 떠올라.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책상에 앉아 공부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었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지 모니터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더랬지. 그 여름에 말이다. 더운 여름에 너를 부를 때면 너는 늘 그렇듯이 고개를 돌려서 크게 입 벌려 웃으며 “왜요? 누나.”하며 벙글거렸더랬지.
이 누나가 말은 못했지만 말이다. 이제 와서 참 부질없는 얘기겠지만… 이 누나는 네 그런 모습이 몹시도 좋았더랬다. 나는 네 웃음에서 희망을 보았던 거야.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엄청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맞서서 오뚝이처럼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던 거야. 그래 동민아.
어제는 크게 웃는 네 모습을 영안실 한 켠 사진으로만 한참을 보다가 왔었어. 그리고 생각했지.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던 네 모습을 왜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거지? 하고 말이다. 또 함께 갔던 우리는 이렇게 영안실에서 멍하니 사진 속 너만 바라보고만 있는지 말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말이다.
이 누나는 말이다. 순식간에 가슴이 타올랐단다. 너를 바라보던 눈과 가슴이 활활 타올라서 내 몸뚱이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단다. 네가 없는 것이, 이제는 너를 볼 수 없는 것이 나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구나.
동민아.
나는 네가 원망스럽구나. 미처 어떤 얘기도 할 수 없게 아무 생각도 못하게 그렇게 쉽게 세상의 손을 놓은 것이 말이다. 아니다. 그뿐이 아니야. 2007년 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의 현장에서, 2008년 탈시설 권리찾기의 곳곳에서 2009년 네가 나서고 움직였던 빈곤의 거리를 기억한다.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010년 기초법 투쟁에서도 너는 몸을 사리지 않았지. 그 빈곤의 거리에서 길거리로 내몬 이 사회가 원망스러웠어.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함께 일하는 활동가로, 너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여야 했던, 내가 더 힘을 내지 못해서 그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그 많은 시간이 원망스럽구나.
언제까지나 그럴 줄 알았어. 이 누나는. 넌 언제나 그랬잖니?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모습, 화를 낼 줄도 모르고 욕심도 없고 우직했고 그리고 당당했지 나는, 이 누나는 그런 네가 자랑스러웠단다. 동민아. 넌 몸 좀 살펴가며 일하라는 내 말에도 네가 필요한 자리라면 어디든 쫓아 다녔더랬지. 집회현장에서도 그랬고, 우리 센터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또 기억한다. 동민아.
스스로 비전을 찾아보라는 소장님 말씀을 듣고는 묵묵하게 실무를 익혀가던 모습을 말이다. 자신이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되면 아랫사람의 충고에도 묵묵히 듣고 고치려 했던 네 모습을 기억한다. 그 더웠던 여름에는 한글 공부까지 함께하느라 곁에 있는 우리까지도 아주 죽을 맛이었지. 늘 그랬어. 넌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내 곁에 있으리라고 말이다.
동민아. 이 누나는 또 잊을 수 없는 현실을 기억한다.
시력이 나빠졌는데도 검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해 안경도 해볼 생각 못했던 현실을 기억한다. 얼마 안 되는 활동비를 꼬박꼬박 모으며 나중에 장사라도 하면서 결혼해서 살아보겠다던 네 소박한 바람을 이룰 수 없었던 현실을 기억한다.

그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소박함이 너무나 절실해서 이 누나는 기억한다. 세상을 함께 살면서 사람이기 이전에 장애인으로 차별받아야만 했던 우리의 현실을 기억한다. 그래 반/드/시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네가 해내려 했던 그 꿈을 이 누나가 함께 이루려 하마. 잊지 않을게.
동민아.!
이 세상 너무나 불편해서 절절했던 이 세상 이제 다 털어버리고 가거라. 네가 간 곳은 언어장애라는 단어조차 없는 그 세상일 거야. 푸른 하늘 위로 흰나비가 날아오르듯이 말이다. 나의 마지막 선물로 남편을 잃었던 시인 신달자 님처럼 동생을 잃은 내가 너에게 시 한 편 들려줄게.
푸른 하늘 위로
흰 나비가 날아오른다.
생전에 단 한 번도 날아오르지 못한
그 남자가
그의 삶이 뼈까지 으깨어져서야
드디어
광막한 하늘 위로
수천의 나비 떼로
날아오른다.
봐요.
당신도 이렇게 날아오르는 때가 오네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니 어때요.
당신이 있던
그 어둡고 춥던 땅
조금은 따뜻하게 보이나요.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른다.
휠훨훨 거칠 것 없는 탁 트인 하늘을
주머니 없는 천사 옷을 입고
유유히 날아오른다.
2011년 1월 4일 우동민 너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정이 누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