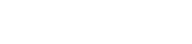최인기의 두 개의 시선

어떤 이가 나무 옆에 앉아 밥을 먹는다. 비둘기들이 옆에서 나란히 식사한다. 나뭇잎 덕분에 햇빛과 그늘이 교차하는 얼룩덜룩한 배경이 펼쳐졌다. 길에서, 그것도 혼자서 먹는 밥 한 끼의 의미가 가벼워 보이진 않다. ‘무거워 보인다’라는 것이 더 어울리는 거 같다. 하지만 비둘기가 있고 비둘기를 쫓아낼 생각도 없는 점심 한 끼는 최소한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 부자나 빈자나 모두 한 끼의 점심을 먹는다. 식단의 차이가 있겠으나 밥의 의미엔 차이가 없다.

또 어떤 이는 서울역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다. 아스팔트 냉기가 뼛속까지 치밀어 올 텐데 그저 잠에 빠져 있다. 그 옆을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날아오른다. 동짓날이 가까워져 오는 12월 평화롭지 않은 서울역 오후의 한때다. 부자나 빈자나 모두 잠을 자야 살 수 있다. 잠자리의 차이가 있겠으나 잠의 의미에 차이가 있을까?

2018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7만 가구에 달한다는 이들이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 찜질방, PC방, 만화방 등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무연고사망자가 2,5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최소한의 주거기준과 안전기준조차 없는 열악하고 위험한 거처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처럼 또는 무연고사망자처럼 죽음으로 자신의 가난과 운명을 증명한다.

서울역은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답게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동짓날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 추모제’가 열린다. ‘고독사’ 또는 ‘시체 포기 각서’, ‘죽지 못한 사람들(사망신고 안 된 사람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장제비보다 높은 장례비용’ 등의 단어가 전시되어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은 관련된 전시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없이 발걸음을 옮긴다.
‘홈리스 추모제’는 이제 꽤 오래된 행사가 되었다. 작년에도 열렸고, 재작년에도 열렸고, 올해도 열릴 것이며 아마 내년에도 다시 열릴 것이다. 숨겨져 있던 가난은 이렇게 매년 멈추지 않고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거리의 노숙인 그리고 쪽방 사람들과 홈리스들의 행동도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 이 나라의 정책을 책임지는 자들은 최소한의 사람답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