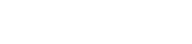최인기의 두 개의 시선


여기 성곽 아래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골목길을 걷다 보면 작은 평상이 보입니다. 따뜻한 햇볕이 드는 날이면 동네 주민들이 평상 위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목에서는 막혔으면 돌아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일 테지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랍니다.
사람 사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요? 서서히 저물어 가는 저녁 해를 바라봅니다. 아주 짧은 시간 푸르른 빛으로 바뀌면서 하나둘씩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창가에 비치는 주황색 불빛은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듯 고즈넉해 보입니다. 하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먹먹하고 남루한 사연들이 넘쳐납니다.


꼬불꼬불 가파른 골목길 안쪽에는 김순자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단칸방이 나옵니다. 불편한 몸으로 창신동 아랫마을까지 약을 타러 가실 때는 하루가 꼬박 걸린답니다. 이렇게 장수마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을 넘고 장애인도 10%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루하루 막노동이나 폐지를 수집해 사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가옥주와 세입자 그리고 주민들 간의 다양한 이견도 존재합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여기저기 다투어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집’이 먹고 자고 내일의 노동을 위해 쉬는 공간이어야 할 텐데요. 언제부턴가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함부로 부수고 깨뜨려 다시 짓는 것이 발전이고 희망이 결코 아니라는 것에 공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가난한 사람들의 보금자리와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노력이 무럭무럭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활력처럼 마을 곳곳이 즐거움으로 넘쳐나면 정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