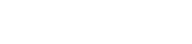새해 들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키도 훌쩍 커지고, 몸무게도 제법 나가서 그러는지 아니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인지는 모르겠다. 경기(驚氣)를 하면 무섭도록 한다. 여러 증상이 한 번에 나타나면서 시간도 길어진다.
이제는 숨이 멎는 것처럼 잠시 호흡이 멈추기도 하고,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도 길어지면서 몸이 무너지는 듯 힘을 쓰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경기는 낮에도 쉬지 않고 이어져 학교와 복지관 선생님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저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많은 경기를 하며 하루를 보냈으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시간에 더 심하게 하며 쓰러진다.
지난해부터 일어나는 경기의 변화는 심하다 할 정도다. 온종일 경기를 달고 지내면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가만히 서 있다가 넘어가는 것도 순식간이라서 바로 곁에 서 있으면서도 잡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럴 때마다 머리에는 밤톨만한 혹이 생기곤 한다. 늘 어른이 곁에 서 있어야 하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서로 신경이 곤두서며 날카로워진다.
병원에서도 별 이야기가 없다. 도무지 손을 쓸 수 있는 녀석이 아니란다.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단다. 시판되고 있는 약은 다 먹어 봤고 이제 더 먹을 약도 없는 상태이며, 외국에서 임상실험하고 있는 약이 있는데 언제 판매될지 장담하지 못하니 바라만 볼 뿐이다.
그렇다고 다시 수술하는 것도 기대하는 효과를 장담하지 못하니 적극적으로 권하지도 못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있다. 이미 한 번의 수술로 실패를 봤고, 다시 한다고 해도 효과 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한다. 그것은 나아진다는 보장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니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
복지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다. 눈은 반쯤 감긴 상태로 몸은 중심을 잡지 못한다. 그런 녀석을 매일 다른 사람들 손에 맡기고 있다. 무슨 중뿔난 일을 한다고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지 매일 스스로 물어보지만 늘 대답이 없다. 아니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매일 그렇게 미안한 마음만 담고 있다.
아침에 경기한 녀석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학교에 밀어 넣는다. 어른의 약속이 아이의 상태보다 앞에 있기에 매일 그렇게 한다.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나 선생님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말은 늘 번드르르하다. ‘이것도 경험이고 그런 경험 속에서 생활하며 자라야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지금을 견뎌야 한다.’ 방학을 하면서 복지관으로 가는 것은 더 험악하다. 아침 일찍 데려다 주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이런 생활이 벌써 1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늘 불안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태반이다. 그래도 지금처럼 간다. 아이가 웃으면 우리도 웃으며 그렇게 간다. 몸이 녹초가 되도록 경기를 하고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저 하고픈 것을 찾아가는 녀석을 보면서 함께 웃음으로 간다.
지금보다 더 심한 상황을 지나온 녀석이다. 단지 지금의 시간이 힘들 뿐이지 앞으로의 시간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힘들게 버티는 녀석을 응원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너무도 길고 험한 시간을 보내 올해 더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지만, 한 걸음 앞으로 가면 가만히 옆에 서서 같이 한 걸음 옮기는 일이니 아이나 어른이나 천천히 앞으로 가면 된다.
오늘도 쓰러져 잠이 드는 녀석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부모로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나, 그렇게 고목 쓰러지듯이 할 때 곁에서 해 줄 것이 없다는 것이나,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손잡아 주는 일 말고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 안고 갈 뿐이다.
최석윤의 '늘 푸른 꿈을 가꾸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