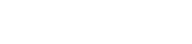예시카 하우스너감독의 영화 '루르드'
 ⓒ프리비젼 엔터테인먼트 |
"당신 생각에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나요?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이 여인을 낫게 하시고 영혼을 낫게 하시며, 원하신다면 육신도 낫게 하소서."
자기 자신의 생 앞에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는 순간이 있다. 어째서 이 불행은 '너'가 아닌 '나'에게 온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의 대상이 '나'가 아닌 '너'인가?
영화 '루르드'는 신의 기적을 보여주듯 풀어나가지만, 결국 '기적'의 의미를 되묻는 영화이다. 사랑도 미래도 제 삶의 건너편에 존재하듯 세계를 바라보는 주인공 크리스티나. 감독 예시카 하우스너는 극도로 감정을 절제하면서 가톨릭 성지인 프랑스 소도시 루르드로 성지순례를 떠난 크리스티나의 여정을 뒤쫓는다.
그러나 구원과 기적을 바라며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루르드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신체치유를 향한 열망은 믿음에 기대어 있지 않으며, 믿음으로 귀결되지도 않는다. 그녀가 시종일관 내뿜는 기류는 기적을 구하는 자의 열렬함이 아니라 막연하고 정적인 감정들로 가득하다. 절망과 고통을 겪은 인간에게 희망이란 무덤덤하고 가벼운 바람과 같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어둠 속에도 살아숨쉬는 자의 열망이 미묘하게 흐른다. 사랑과 질투, 고통과 두려움, 희망과 좌절이 너무나도 고요히 스쳐 지나가기에 그녀가 가진 이 빈 여백은 슬프고 외로우며 고통스럽고 매혹적이다.
기적에 대한 믿음이 아닌 기적을 향한 막연한 감정들이 크리스티나를 통해 요동칠 때 아무렇지 않게 기적이 행해지며,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또 기적은 그렇게 사라져 간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직립보행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녀가 왜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나이냐고 신 앞에 물음을 던지듯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가 왜 자신이 아닌지를 묻는다. 이 혼란스러운 의문 앞에 신부는 "늘 해명을 찾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은 불가사의"라고 답한다.
누구나 기적을 꿈꾼다. 그것은 고통받는 인간의 몫이며, 삶을 지속하는 순간까지 갈망하게 된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자신의 삶이 좀 더 고통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언제나 음악이란 이곳을 제외한 저편에서만 흘러가는 무엇처럼 느껴진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크리스티나가 다시 제 삶에서 음악이 비껴가는 순간 알듯 모를 듯한 표정으로 자신을 활동보조하던 마리아의 흥겹게 노래하는 모습을 바라본다.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대답도 없다. 신은 존재하는지. 구원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은 내 몫이 되며 어떤 것은 네 몫이 되는지. 그러한 질문을 던지며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득 답을 구할 수 없는 이 세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단지 '나'가 아니기에 '너'의 감추어진 고통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고 내 삶은 고통으로만 가득 찬 것 같다.
그러나 영원히 저들의 것일 것 같은 음악 역시도 잠시 그렇게 머물다 갈 것이다. 고통은 비극이지만 비극 속에서 인간은 성숙해져 간다. 음악 바깥에 선 그녀의 미세하게 흔들리는 마지막 시선이 관객을 사로잡는다. 크리스티나는 아름다움은 그렇게 그곳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게 완성되어 갈 것이다.
 ⓒ프리비젼 엔터테인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