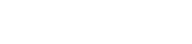힘든 하루를 보내고서
복지관 문을 나서는 녀석을 보면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눈은 반쯤 감겨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몸은 앞으로 쏟아질 듯하고, 다리는 중심을 잡지 못해 휘청이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고, 침은 주책없이 흐른다.
선생님 손에 이끌려 나오는 녀석이 비틀거리면서 내게로 온다.
“오늘 많이 힘들어하네요”
“오늘 만요?” 웃으면서 한마디 던져본다.
“오늘은 더 심한 거 같은데요” 선생님도 질문 자체가 우스운지 가만히 웃으며 대답한다.

아침에 경기(驚氣)를 하고서 학교에 간다. 침을 흘리면서 고개 들지 못하는 녀석을 데리고 꾸역꾸역 들어간다. 미안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며 그렇게 학교에 보낸다. 겉으로 하는 말이야 간단하다.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가야 한다는 것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라는 것이다. 그 정신에 어울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 정도로 아프면 너는 학교 가겠냐'는 물음을 스스로 하면서도 발길은 이미 학교에 들어서고 있다.
정말 아이에게 미안하다. 그 짧은 거리를 차로 이동하면서 아이에게 말을 건넨다.
“한빛 아빠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알지?”
“네~” 녀석은 큰소리로 대답해 준다. 환하게 웃으면서 말이다.
그게 더 아프다. 그 웃음이 그렇게 만든다. 고개도 들지 못하던 녀석이 씩씩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질문을 알아듣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물으니 대답을 하는 것인지 속내가 궁금하기도 하다.
저녁에 집에 오는 길에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반응은 똑같다. 정말 미안한 마음 가득이다.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본다.
결국 내 욕심이다. 아무리 아이가 아프다고 해도 집에서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보내는 시간이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여긴다. 경기를 하고 난 후의 후유증이 사라지면 다시 생기를 찾을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도록 해줄 것이란 생각에 매일 어르고, 꼬드기고, 협박해가면서 아이를 학교에 밀어 넣는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욕심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음흉함이 드러나는 행위라 할 수 있겠다.
저녁으로는 경기가 좀 과하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밥 먹을 때 경기를 하면 손은 아이를 챙기고 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상상의 화면들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할지를 염두에 두는 상상은 그 짧은 시간에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 낸다. 경기를 하다 일어난 사고가 잦았던지라 더 걱정이 커진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멀뚱히 천정만 쳐다보다가 텔레비전 소리에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며 정신이 돌아왔음을 알려준다. 그 틈을 이용해 얼른 수저를 손에 쥐여주고 반찬 시중을 들어주니 덥석덥석 잘 받아먹는다. 후닥닥 먹이고, 상을 물리고, 씻고, 다시 컴퓨터에 앉으니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다.
정리를 하는 동안 잠시 컴퓨터에 빠져 있더니 슬그머니 나와 자리를 잡는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다시 평온이 찾아온다. 이전에는 잠이 들면 경기를 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잠을 자면서도 경기를 하는 통에 다시 둘이 붙어서 잠을 잔다. 여름 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걱정이 된다. 매년 하나 둘 덜어내도 시원찮은데 반대로 더해지고 있으니 답 안 나오는 상황이다.
최석윤의 '늘 푸른 꿈을 가꾸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