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 다 빠져나가도록 경기하는 날에는 속수무책이다
멀뚱히 아이만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라니…
여전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 하루하루가 아이에게는 전투(戰鬪)다. 하루 10여 차례 일어나는 발작으로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어 보인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 자신도 서글픔이라 느낄 것이다. 그런 고통을 한 번도 함께하지 않은 아비의 처지에서 뭐라 이야기할 것도 없다. 그저 툭툭 털고 일어서면 잘했다고 한 번 안아주는 것이 전부다.
아침이 부산하다. 일찍 일어난 녀석은 컴퓨터 앞에 앉아 아침을 시작하고, 이것저것 챙기며 준비를 하는데 ‘끄-윽’하며 쓰러진다. 얼른 달려가 다독여 주고 다시 아침을 준비하는데 조용하게 앉아 아무 소리도 없다.
정신을 놓은 녀석은 이미 일을 저지르고는 꼼짝도 없이 앉아 있다. 경기(驚氣)를 하면서 소변 실수를 한 것이다. 얼른 씻기고 닦아내고, 다시 옷을 갈아입히고서 아침을 먹인다.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은 정신으로 제비 새끼처럼 입만 벌리고서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는 녀석의 아침은 그렇게 책상에 앉아 해결하고서 반짝 정신이 돌아오자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손을 잡아끌며 나가잔다. 이럴 때는 얼른 따라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신발을 신고 무사히(?) 집을 나서 학교로 간다. 아침을 힘들게 시작하더니만 학교에서도 크게 두 번 쓰러지고 자잘한 경기가 쉬지 않고 일어나 종일 침을 흘리며 지냈다고 한다.

새 학기에 새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학년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간다. 4학년 때 같은 반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찾아와 같이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정신으로 찾아온 친구들을 제대로 맞이할 수나 있었을지 모르겠다.
복지관에서도 경기는 여전해서 모든 활동을 접어야 할 정도라고 하고, 경기를 하며 넘어가면서 얼굴을 부딪쳐 입술이 터졌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화로 묻는다. 부리나케 복지관으로 가니 서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정신이 없다. 불러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비틀거리며 눈을 맞추지 못한다.
집에 와서도 여전하다. 종일 침을 흘리며 지냈다고 하는데, 오늘은 맑은 정신으로 지낸 시간이 없다는 말과 같다. 경기를 하는 아이가 침을 흘린다는 것은 경기가 속에서 지속된다는 것으로 어찌 보면 이게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 드러나는 경기는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지만, 침을 흘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힘든 하루를 보낸 녀석이 가만히 누워 잠들었다. 잠든 녀석을 보면서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괜히 싱숭생숭해진다.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 생각이 든다. 아이의 상태가 어지간하면 그냥 쉬어도 될법한데 꾸역꾸역 학교로, 복지관으로 밀어 넣고는 종일 모른 척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 두고서 제 일을 보러 다니는 것도 그렇다.
입장이 바꿔 생각해 보면 ‘뭐 저런 부모가 다 있지?’라고 할 정도니 미안함이 새록새록 일어난다. 가장 미안한 것은 아이에게다. 늘 아침에 헤어지면 저녁나절에야 얼굴을 내밀면서 친한 척은 무진장으로 하고 있으니 말이다. 오늘처럼 종일 경기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날은 더 그런 마음이 든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꺼낸다. 주절주절 넋두리하듯이 혼자서 떠들고 있는데 아이는 반쯤 감긴 눈으로 초점도 맞추지 못하는 눈으로 나를 보는 듯, 다른 곳을 보는 듯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집에 와서도 계속 넘어가는 녀석을 붙들고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자 목을 감싸 안고서는 매미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물어보자 두 팔을 한껏 벌리며 머리 위로 치켜올린다.
그만큼 힘들었냐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니 아프다는 시늉을 한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 머리를 만지면서 아프다고 한다. 가슴이 시리다는 말이 어떤 때 쓰는 말인지를 알게 해주는 날이다.
‘나는 뭐하고 다니는 거지?’
다시 이 질문이 튀어나온다.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런 시간들이 아이를 위한 것인지 묻는다. 혼자서 버티는 시간들. 그리고 고통. 온몸이 틀어지고, 굳어지는 시간. 온종일 침을 흘리면서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는 녀석에게 지금이 아닌 내일의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도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정답이 없는 것이 삶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아이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최석윤의 '늘 푸른 꿈을 가꾸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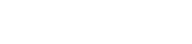

딸국질 몇번으로도 온 종일 정신이 없는데 경기는 얼마나 힘들까요...
쉬운 말일 수 있지만 마음을 담아서 지지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