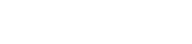지난 3월 초부터 4월 20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진행된 나와 아들 균도의 세상걷기(국토순례)가 지난 6월 29일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통과에 이바지했다고 장애현장에서는 이야기한다.
장애아동에게,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가장 절박했는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균도를 키우면서 진즉 알게 되었고 균도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균도는 졸업 후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마저 센터가 집 근처에 없어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대중교통을 타는 데에 매여야 한다. 부산에서 평균 2년 이상 입소 대기기간이 필요하다 하니 균도는 처지가 나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겪을 때면 장애아동들은 사회의 몫이 아니라 부모의 희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된다.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비장애아동 중심, 장애인복지법은 성인 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되어 장애아동은 어느 영역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균도와 같이 일반적인 발달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을 통칭하는 발달장애인은 만 19세 이전에는 장애인의 75%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고, 질환 등 중도 장애인이 나타나는 성인기를 거치면서 6%의 소수 장애인이 된다.
어느 법에서도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장애아동의 권리가 이번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일정 정도 회복되게 되었다.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법안 수정, 법안 통과 연기를 거치면서 4월 제정의 기대를 깨고 6월 임시국회에서 겨우 통과했다. 진즉 있어야 할 법을 만들면서도 예산 부족, 부서간 조율을 핑계로 법 제정을 늦춘 복지부의 행태는 지금 생각해도 답답하다.
이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시도 이러한 대응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다. 매년 4월20일을 즈음해서 내가 활동하는 부산장애인부모회는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활동에 참여한다. 장애인 부모와 중증장애인 당사자 등이 부산지역 실천단을 꾸리고 부산시 장애인 복지 중 미비한 점을 분석해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매년 정책 제안 활동은 되풀이되지만, 부산시는 항상 '예산의 문제' 때문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우리를 설득하려 한다.
심지어 실무 협의를 위해 사전 약속 후 시청을 방문해도 대표단을 기다리게 하거나 협의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때도 있었다. 부산시의 장애인 지원 제도 중 타시도보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자 "돈 맡겨놓은 거 있냐?"는 반응을 보여서 담당 부서장을 만나 사과를 받기도 했다. 중증장애인, 장애인 부모의 요구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런 반응을 여과 없이 보인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하고 이야기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그 수준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정책요구안의 몇 가지를 추려보겠다.
1.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2.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및 시설 확충
3.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원 확충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5.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예산 증액
6. 장애인의 탈시설 계획 수립
7.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확대
부산시의 장애인들은 타지역 장애인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부산시는 추가시간을 포함해 월 최대 200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올해 최대 360시간까지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장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대전과 광주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운영비와 시설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해 프로그램의 질 저하를 고민하고 있으며, 일 년에 400명의 학령기 졸업생이 나오지만 시설 부족과 프로그램 질 저하로 집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갓 학령기를 마친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한 번쯤은 시설에 자녀를 입소시킬까 고민한다.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을 만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설을 선택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다. 시설도 자녀의 자립을 지원할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한 탓에 몇 년씩, 몇십 년씩 시설에서 지내는 일이 비일비재한 까닭이다.
장애인도 사회 속에서 자립생활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꾸리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사회 전반의 지원 부족으로 집 혹은 시설을 벗어나는 순간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편의시설의 확충을 한다고 하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에 비할 수 없는 많은 시간이 든다.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4배 정도 높은 이혼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 자녀가 있는 엄마는 70%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이 과연 가정만의 아픔이고 문제인가? 이제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일부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정확하게 장애인을 이해하는 것이로 생각한다. 균도와 세상걷기를 진행하면서 외쳤던 모토가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균도와 세상걷기는 이제 첫 단추를 끼었다. 아직도 걸어야 할 길이 멀다.
우리 사회는 이제야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다. 예민한(?) 국회의원들이 먼저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을 압박하고 있다. 등록장애인이 252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 가족을 더한다면 전 국민의 20% 이상이 장애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몸에 장애가 있더라도 누구보다 부드럽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부산시가 장애인을 중요한 지역의 구성원으로 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장애인 정책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부산일보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