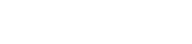영화 무산일기
 ▲'무산일기' 포스터. |
"야, 머리가 그게 뭐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들어가면 절대로 북한에서 왔다는 말하지 마라, 응?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만 해라. 너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니야. 그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25'로 시작하는 이들. 그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당도한 한국에서 그들은 낙인을 달고 새터민으로 분류된 채 살아간다.
125라는 낙인은 이 땅에서 세터민이 '우리'라는 테두리 밖에 존재하도록 규정짓는다. 신분을 증명해야만 하는 직업시장에서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 사회에서 노동력을 팔지 못한 자들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과 속고 속이며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 위태롭게 발버둥을 친다.
지난해 개봉해 독립영화의 돌풍을 일으킨 박정범 감독의 '무산일기'는 탈북자 전승철이라는 인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묵묵히 그려내고 있다.
전승철. 탈북자인 그는 서울의 한 공간에 터를 잡아 살아가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주변부에서 위태롭게 삶을 지탱해갈 뿐이다. 그에게 일을 제공하는 이들은 허드렛일을 제공하는 빌미로 온갖 폭력을 일삼으며 노동력을 착취한다. 그에게는 폭력을 견디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견딘다는 것 말고 다른 생존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전승철은 미련하게 자신을 향해 가해지는 폭력을 고스란히 받아낸다. 그러나 서울 하늘 아래 이방인으로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를 위로해줄 한 줄기의 빛조차 없다. 그의 곁에는 같은 처지면서도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끝내는 친구마저 이용하는 경철만이 있을 뿐이다.
신앙생활도 그에게 구원이 되지 못한다. 교회에서 만난 숙영의 주위를 맴돌지만, 그의 마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 승철에게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승철은 길에서 노점상이 버리고 간 백구 한 마리에게 모든 애정을 쏟아붓는다. 승철은 이 사회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는 없었지만, 강아지만은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애써 보듬는다.
그리고 승철은 이 땅에 살기 위해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이 사회가 자신에게 가한 폭력을 통해서 승철이 몸소 체득해 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희망이 아니다. 승철은 어두운 밤거리를 이 사회의 단면처럼 어둡고 쓸쓸한 색채를 지닌 채 가로지른다.
 ▲영화 '무산일기'의 한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