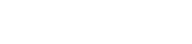가끔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H는 초임교사 시절에 만난 일곱 살 여자아이인데 뇌병변장애와 약간의 정서장애가 함께 있었다. 가끔 공부시간에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거나 떼를 써서 애를 먹긴 했지만 하나씩 배워가려고 애쓰는 아이였다.
H는 야무진 입매가 참 예뻤는데 이상하게도 말을 하지 못했다. 먹는 것이나 혀를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말을 못 할 까닭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 언어치료사가 따로 불러내어 날마다 언어치료를 해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를 보고서도 입 모양만 움찔거릴 뿐 소리는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H가 사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어 보였다. 예나 아니요 정도는 표현할 수 있었고,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손으로 가리키거나 직접 몸으로 해치우곤 했다. H를 아는 어른들이라면 누구나 H가 말을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열 살이 넘어가면서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H의 말문이 트였다는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들었다. 학교를 옮기고 나서도 제법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다. 더 놀라운 소식은 말귀는 알아듣는 듯했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학습에 대한 흥미는 또래 아이들과 견주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6-7년 전의 일을 술술 이야기한다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합주 연습을 하다가 악기를 망가뜨려서 선생님께 야단맞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다시 또 시간이 흐른 뒤에 우연히 경기도의 한 재활원에서 H를 만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을 했던 아이를 십수 년이 지난 뒤에 만나게 된 셈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니 무뚝뚝한 얼굴에 입가에만 살짝 미소를 띠고 대꾸했다.
“공.진.하. 선.생.님!”
H의 목소리를 듣게 되다니, 또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주다니, 정말 상상도 못 했던 큰 선물이었다.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색하기는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꽤 오랫동안 H와 옛날이야기를 나누었다. 1학년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들의 이름을 얘기하며 안부를 묻기도 했다. 1학년 여름방학 때 통합놀이캠프에 놀러 갔던 것이 좋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눈물이 나도록 반갑고 고마웠다.
아마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할 것이다. 말 한마디 못하던 아이가 어느 날 입을 열어 말을 하고, 늘 휠체어 신세를 지던 아이가 영화 속 포레스트 검프처럼 뛰어다니고, 같은 그림도 찾지 못해 쩔쩔매던 아이가 구구단을 외고, 능숙하게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많은 사람이 특수교사에게 바라는 것이 이런 기적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일까,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의 제목도 ‘미라클 워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적은 항상 딱 거기까지다. 말을 못하던 H가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적은 거기까지다. 그 아이는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지내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 아이를 가르쳤던 교사들은 H가 말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제 일처럼 기뻐하고 뿌듯해했지만, 사실 그 아이의 삶의 틀은 달라지지 않았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헬렌 켈러가 암흑 속에 갇혀 지내다가 설리번 선생을 만나 수돗가에서 ‘물’이라는 단어를 깨우치게 되면서 수화를 배우고, 점자를 배우게 되었고, 결국은 하버드대학교 졸업생이 되었다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도 딱 거기까지다. 실제로 헬렌 켈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가 거기까지라는 이야기다. 내가 봤던 대부분의 위인전과 영화가 그랬다.
헬렌 켈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가족의 편견과 반대에 부딪혀 사랑을 이루지 못했으며, 단순히 장애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모든 차별과 억압, 편견에 맞서 싸우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지역사회와 단절된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면서 또박또박 말하는 H.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어렵지만, 몸짓과 손짓으로 필요한 것들을 표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또래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H. 둘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고를 것이다.
물론 특수교사가 하는 일은 내가 만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열심히 가르쳐서 일상생활에서 자립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사회 속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끔은 교사와 부모들조차 궁극적인 목표를 잊고 지내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 속에서 일상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지 못한다면 그 어떤 기적도 소용없는 일이 아닐까?
설리번과 같은 특수교사를 바라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무책임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털어놓아야겠다.
저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뿐 아니라 마을에서, 일터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도서관에서, 박물관에서, 놀이공원에서 그런 일상을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굳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된다면, 적절한 활동보조 인력 지원이나 보조공학 도구가 제공된다면, 부양의무제가 폐지된다면,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이 채워진다면 한 걸음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상 말입니다.
특수학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끔 동화도 씁니다. 교실에서는 좀 웃기고, 덜렁거리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동화는 좀 슬퍼집니다. 사실 장애 학생들을 둘러싼 현실을 생각하면 제가 쓴 동화는 슬픈 것도 아니지요. 좀 더 재미있는 동화를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동화들이 ‘헛소리’가 아닌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