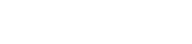매일 아침 전철 속 출근 인파를 경험하고, 운동을 하러 버스를 타고 체육관에 가고,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않고도 관광명소를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즐겁게 가는 것… 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이십대 중반의 나이에, 혹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나이에 가능한 것일 수 있다. 대책 없이 크기만 한 캠퍼스에서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어 외부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나를 포함하여.
간혹 오래된 기종에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버스는 차체가 내려앉고 스위치로 펴고 접을 수 있는 경사로가 장착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주변 도시들을 연결하는 전철(‘바트(Bart)’라고 불린다)의 모든 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휠체어 사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철과 승강장 사이에 휠체어 바퀴가 빠질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알록달록 갖가지 고풍스러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여 오늘날까지 관광자원으로 운행하는 전차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한 사람이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기조차 위태할 정도로 좁고 열악하게 보이는 그 안에서, 운전기사가 철판으로 된 경사로를 꺼내 도로보다 높아져 있는 승강장과의 사이를 연결해준다. 혹여 다른 사람의 발을 밟을까 노심초사하며 휠체어 석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어떻게든 가능하게 하는 제도 자체도 가히 놀랍지만, 이 과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인상 깊다. 버스에 장애인을 태우는 일은 꽤나 번거롭다. 운전기사는 휠체어에 안전장치를 채우기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한다. 편하게 앉아있던 세 명의 승객들이 한 사람을 위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긴다. 시간은 몇 배나 지체된다. 불평의 말은 물론이거니와 미간을 찌푸리는 사람조차 없으니, 겸연쩍고 미안해진다. 이 불편한 감정은, 머릿속에만 존재해왔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익숙지 않기 때문일 테다. 이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 꼴이 되지 않으려면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이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 위해서 함께 감당해야할 몫이 있다는 것을, 장애의 여부를 떠난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왼쪽)휠체어를 타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 (오른쪽) 버스 운전기사가 직접 경사로를 꺼내 설치하는 모습 ⓒ현아
언젠가 한국에 있는 아기 엄마가 된 친구가, 아기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한 적이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팡이나 워커를 사용하는 노인들, 유모차를 끄는 부모 등 다양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대중에게 열려 있을 때에야 대중교통이라 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소외되는 사람들-이를테면 버스 정류장, 전철역까지 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파라트랜짓(Paratransit)’이라고 하는, 리프트가 장착된 소형 버스가 대체 교통수단으로 운행한다. 까다로운 인터뷰를 거쳐 이용자로 등록되면 예약할 수 있고, 예약된 시간에 원하는 출발지에서 차량이 대기한다.
하지만 이곳의 대중교통도 여전히 배제시키는 대중이 있으니, 시청각장애인들이다. 창을 통해 뚫어져라 길 이름을 헤아리고 있지 않으면 여기가 무슨 역인지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 없으며, 오는 버스마다 나에게 일일이 번호를 물어오는 시각장애인을 만난 적이 있다. 전철역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요소가 부지기수다. ‘대중’의 범위는 끝이 없고, 던져지는 과제도 끝이 없는 것만 같다.
환상으로 존재했던 나라는 정말로 나를 자유롭게 해줄까. 지금까지로 보자면 꽤나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인, 이동의 자유로움이 주는 심리적 자유가 얼마나 막대한지 만끽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의 미국의 활발한 이동권 투쟁의 결과물이다. 하늘을 나는 일은 현 인류의 신체구조상 실현 불가능하지만, 버스를 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은 누구에게나 현실이 되어야 한다.
현아의 기분 좋은 편지 한 통 장애인이며, 여성이며, 아시안으로, 다양한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고 그렇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학 장애인권동아리 시절 장애인운동을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글로써 꾸준히 소통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