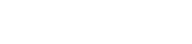저는 15살 때까지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마당에는 강아지들이 졸음에 겨워 나비를 쫓고, 할머니가 사다주시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지냈지요. 저는 모두가 매미가 되어가는 데 저만 애벌레로 평생 지낼 것 같은 두려움에 떨며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 운 좋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만, 저는 그때의 생활을 ‘지하생활’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사실상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삶. 화려한 지상을 바라보면서 밤마다 외로움에 떨어야 하는 삶.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생을 유지해야 하는 삶.
한국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일정 기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들을 ‘지하생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생활자들은 지상의 인간들로부터 병든 인간, 추한 인간,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지하생활자들이 대거 지상 위로 올라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지상의 원칙들은 무참히 깨지고, 새로운 것들은 창조되며, 우리들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저는 비마이너의 존재의의가 바로 지하생활자들의 세계등장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고, 창조적이며, 재능 있고, 매력적인 우리들, 또는 우리의 동료가 지하에 갇혀 있습니다. 그 지하는 장애인 시설일 수도 있고, 가족들이 있는 집일 수도 있으며, 학교나 회사에 존재하는 고립과 소외, 배제의 문화 한가운데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글을 쓸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지하인’으로서의 원영입니다. 지하인 원영은 때로 소외되고, 억압받고, 욕망에 불타는 원영이고, 따라서 저를 둘러싼 그리고 장애와 사회의 긴장관계 속에서 발산되는 욕망과 억압, 분노에 대해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세계’를 관찰하는 존재로서의 원영입니다. 그 원영은 우리의 상황을 관찰하는 학문적이고 담론적인 차원에서 글을 쓸 것입니다. 여기서는 장애인권 담론에 대한 사회과학적, 법률적인 주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지하생활자들의 세계등장이며, 지하와 지상을 구분하지 않는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칼럼을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되게 서술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한 방향으로 일 년 간 글을 쓸 밑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당사자로서 또는 장애문제를 관찰하는 관찰자로서 어느 곳에도 고정되지 않고 자유로운 시점을 견지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비판을 기대합니다.
지체장애인. 올해가 20대의 마지막. 지하생활자로 15년간 살았고 세상으로 나온지 올해가 지나면 15년이 된다. 한국사회의 장애인치고는 운이 좋아서 대학을 지나 대학원까지 왔다. 관심사는 연극, 장애학, 생물학, 드라마, 소설, 진화론 등 다양하다. 까칠한 말투로 종종 비난을 듣는다. 스스로를 섹시하다고 공언하고 다닌다. 원영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
원영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