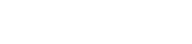반년 동안 이국 땅에서 동고동락 해왔던, 대학교 후배(그 친구 역시 휠체어를 사용한다)와 뜨거운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의 꽤나 유명하다는 클럽에 간 일이 있었다. 그 날 밤의 새로운 시도는 우리 둘 모두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는데, 단순한 즐거움 이상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곳은 사실상 게이(동성애를 하는 남성)들을 위한 클럽이었지만, 게이가 아니어도 출입이 가능했다. 현란하게 돌아가는 조명과 말로만 듣던 ‘부비부비’를 경험하게될 줄이야. 봉으로 착각했는지 휠체어의 뒷부분을 잡고 혼자 춤에 심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킨쉽을 하면서 춤을 유도하거나 술을 사주겠다며 권하는 사람이 있었다.
방에서 신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추는 것은 즐겨하지만(나 이외의 사람은 없어야 한다), 클럽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춤을 추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서로가 서로를 시선으로써 구속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자유스러운 행동을 최대한 존중했다. 마이너리티(minority) 간의 동질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두운 조명 탓이었을지도 모른다.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누군가가 보는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었다.
동성애자들의 진한 애정표현이 익숙치 않았던 나 역시 처음에는 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곧 내가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음을 깨닫고 ‘아차’ 싶었다. 소소한 행동부터 정책의 고안에 이르기까지 그 출발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선, 누군가를 그 범주 안에 굳이 넣고자 하는 자의적인 태도가 아닐까. 물론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몸,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거리에서 자주 만나거나 혹은 친구로, 동료로, 소중한 사람으로서 곁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익숙함’의 범주는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향한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옴에도 꿈쩍 않는 정부의 일꾼들을 보노라면, 차이를 그 자체로 받아들여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 곳 사람들의 제각기 다른 피부색, 독특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나의 시선이 관대해졌듯이, 나도 사람들 속에서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니 행동이 자유로워진다. 상상으로만 머무를 줄 알았던 장면들이 종종 현실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서로가 서로의 시선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 부문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고, 그를 없애려는 움직임들이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장애/인을 향한 시선에서의 해방은 장애해방의 첫 걸음일 뿐이지만, 항상 낯선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 같은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스스로 가하는 행동의 제약으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어떠한 환경에서는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곳에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
현아의 기분 좋은 편지 한 통 장애인이며, 여성이며, 아시안으로, 다양한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고 그렇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학 장애인권동아리 시절 장애인운동을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글로써 꾸준히 소통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