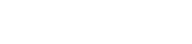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마이너의 서재]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
지인 중 한 명은 뇌병변이 심한 아이를 기른다. 아이는 지체-발달 중복장애인이다. 그녀는 자기 자녀를 무척 사랑한다. 늘 예쁜 옷만 입히고, SNS에는 아이 사진만 가득하다. 주변인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를 자랑하는 레퍼토리도 바뀐다. 하지만 어느 날 무심결에 던진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병원에서 오진만 하지 않았어도 낳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을 확 고소하려다 참았다”고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의 당혹감이란. 그리고 그 당혹감은 ‘낯설음’이었다. 외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장애인 가족의 분노.
장애인 자녀와 부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곧잘 ‘미담’으로 소비되곤 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조력자가 부모(특히 어머니)인 사례는 영화로도 제작되고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된다. 그리고 이는 명절이나 가족의 달 인기 상품이다. 이러한 영상물들은 ‘세상으로부터 장애인이 받는 차별과 멸시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주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가정‘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을 만나고 그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징후부터 암과 같은 신체적 징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호소하는 몸과 마음의 통증은 비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보다 훨씬 깊고 넓다.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는 ‘정상’의 범주에서 비켜나 있는 아이와 어머니의 바로 이 불편한 관계를 그린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 나아가 세상과 아이는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다. 200페이지가 안 되는 얇은 책이지만 마지막 책장을 넘기는 독자는 책이 무척 길다고 느낄 것이다. 지루해서가 아니라 읽는 내내 한 번도 숨을 편하게 쉬지 못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책은 ‘가족 이야기’라기 보다는 ‘스릴러’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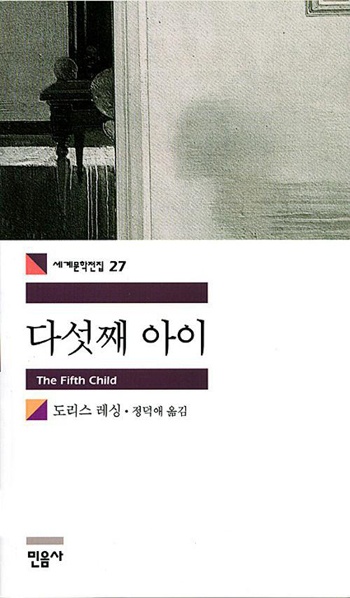
책의 줄거리는 단순하다. 답답할 만큼 고지식한 점이 닮은 해리엇과 데이비드가 만나 결혼을 하고,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 무려 넷이나. 가족들이 ‘너무 많이 낳는다’며 타박을 하지만, 이 가족은 아랑곳 않고 행복을 만끽한다. 다섯째를 낳기 전까지. 다섯째 아이 ‘벤’은 엄마 해리엇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힘이 세고 난폭한 성향을 드러낸다. 벤은 곧 온 가족에게 공포의 대상이요, 행복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된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엄마 해리엇만은 그런 벤을 가족들로부터 보호하고 ‘제거되지 않도록’ 애쓴다.
사실, 책의 어디에서도 벤이 장애인이라는 언급은 없다. 벤은 그저, 외형이 특이하고(두툼한 어깨, 구부정한 등, 눈썹에서부터 정수리 쪽으로 경사진 이마, 노르스름한 피부,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황록색 눈) 폭력적이다. 손님이 데려온 고양이를 죽이거나, 생닭을 씹어대거나, 타인과 정서적 교감을 하지 못한다. 가족들은 이런 벤을 두려워한다. 결국 그들은 벤을 한 요양원에 보내버린다. 하지만 해리엇은 기어이 그를 되찾아온다. 이때부터 소설은 본격적으로 해리엇과 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소설이 진행될수록 가족들은 물리적으로건 감정적으로건 이 둘에게서 멀어져 간다.
하지만 해리엇이 이 모든 일을 벤을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엄마 된 도리’, 즉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전반적으로 안도하게 되었고 자신이 어떻게 그러한 긴장을 그렇게 오래 견뎌냈는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벤을 추방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벤에 대해 생각할 때 그건 사랑이나 온정의 마음에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내부에서 정상적인 감정의 불티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자신이 싫었다. 오히려 죄의식과 공포감으로 그녀는 밤새 잘 수 없었다.” (본문 105쪽)
적어도 소설에서는 해리엇이 벤을 사랑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녀는 자기 아들을 두려워한다.
“벤은 말없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해리엇은 그 차갑고 노르스름한 초록 눈에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어쨌건 그녀는 결코 벤의 표정을 읽었던 적이 없으니까! 때로 그녀는 벤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다 평생을 다 보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본문 90쪽)
이는 차라리 증오에 가깝다. 벤이 얼마나 ‘정상이 아닌지’ 그녀는 끊임없이 확인한다. 자신의 증오가 정당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자신을 연민하기 위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다.
해리엇은 “모두 나를 죄인 취급한다”고 분노하기도 한다.
“난 벤이 태어난 이후 줄곧 벤 때문에 비난을 받아온 것 같아요. 난 죄인처럼 느껴요. 사람들이 내가 죄인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요. (...) 이건 정말 희한해요. 이전에,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네 명의 정상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멋진 아이들을 갖다니 넌 정말 똑똑하구나! 그 애들은 모두 네 덕분이야. 훌륭한 일을 해냈어, 해리엇!’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 하지만 벤에 대해서는-전 그저 죄인이죠!” (본문 140쪽)
『다섯째 아이』는 이렇게,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며 가족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질감과 고통을 파격적으로 그려낸다. 벤을 기르면서 해리엇은 세상으로부터 늘 죄인 취급을 받는다. 그렇다면 벤과 같은 자녀를 기르는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죄인’이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징벌인가.
우리는 이들의 그림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가족은 언제까지 ‘불쌍한’ 장애인의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가족의 무한한 사랑은 역설적으로 사회에서 장애인을 포용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는 장애아동이 성장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오롯이 가족의 몫으로 돌린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한 가족들은 희망의 메시지로 포장되어 전시된다. 그 이면에 있는 상처투성이의 얼굴은 깨끗하게 편집된다.
하지만 도리스 레싱은 『다섯째 아이』를 통해 ‘가족 신화’가 만들어내는 폭력을 에두르지 않고 보여준다. 200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88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빌어먹을 재앙(Bloody disaster)"이라고 반응하는 날카로움을 벼리고 있던 도리스 레싱. 늘 기성 체제에 의문을 제기했던 작가의 시선은 그녀의 대표작 『다섯째 아이』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난다.
‘남다른 아이’, 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유독 엄마인 해리엇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벤의 아빠인 데이비드는 일찌감치 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아이를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친척들의 강요에 갈등하는 해리엇과 달리 데이비드는 단호히 결정을 내린다. ‘벤은 우리 아이’라며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해리엇에게 데이비드는 “그 앤 내 애가 확실히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소설 후반부로 갈수록 주변 인물들은 배경으로 희석되고, 결국 남는 것은 벤과 그의 엄마, 해리엇이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 자녀의 양육은 대부분 엄마의 몫이다. 왜일까. 이 역시 ‘열 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한 몸이었던 두 사람’, 즉 모성신화에 기대고 있는 낭만주의적 족쇄가 아닌가.
가족, 특히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고전적 테마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다섯째 아이』는 영화 ‘케빈에 대하여’를 떠오르게 한다. ‘케빈에 대하여’의 원제는 ‘We Need to Talk about Kevin'. ’우리는 케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해‘이다. 덮어둔다고 있는 일이 없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 장애인 가족의 삶, 그들의 빛만 칭송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림자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 아이』는 이 그림자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