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의 서재] 올리버 색스의 『환각』
몇 달 전의 일이다. 어느 날 밤, 난 내 방 책상 밑에서 ‘검고 커다란 벌레’ 한 마리를 ‘보았다.’ 주로 밤에는 전등을 꺼놓은 채 책상 스탠드 불빛만을 켜놓아서 정확한 형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분명 발이 여러 개 달린 바퀴벌레류의 벌레였다. 크기는 성인 여성 손바닥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큰 벌레를 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여름철 모기 한 마리 죽이지 못할 만큼 벌레에 대한 공포가 크다. 그 즉시, 난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겐 몸이 마비될 정도의 공포였다. 새벽에 가까운 깊은 밤이라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뒷목은 뻣뻣해졌고 숨이 가빴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그래, 우선 불을 켜서 확인해보자. 소리 지르면 그때 다른 가족이 와서 구해주겠지. 전등불을 켜고 숨을 멈춘 채 고개를 책상 아래로 홱, 꺾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사라지고 없었다. 플래시를 켜고 책상 바닥 어두운 곳도 이리저리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떠올렸다. 그 벌레는 내가 며칠 전 그린 ‘그것’과 닮아있었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혐오하고 있던 그 무엇에 대한 흔적이었다. 검고 시커먼, 가느다란 발이 여러 개 달린 벌레. 그렇다면 장롱 속에 봉인해둔 그 그림이 도화지에서 기어 나오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 집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개미 한 마리 나온 적 없었다. 집안에서 그런 벌레도 당연히 본 적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 의심’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저 ‘벌레가 나타났고 나는 그것을 봤다’라는 ‘사실관계’만이 내겐 존재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무의식의 반영? 혹은 ‘헛것’을 본 걸까. 그러나 어떠한 이름을 붙이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내가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았을 때 내 온몸을 휘감았던 감각들. 그 밤의 기억은 여전히 내게 선명하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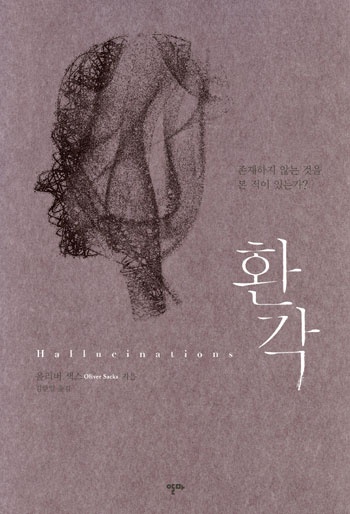
올리버 색스의 『환각』은 이러한 혼란스런 경험, 희뿌연한 상에 대한 초점을 찬찬히 맞춰준다. 환각(幻覺)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느끼는 경우를 칭한다. 그러나 이것은 환각을 경험하는 당사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기에, 외부 세계를 타인과 공유하는 지각 현상과는 분명 다르다. 그래서 환각은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의 주요 증상으로 즉각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환각을 경험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당혹스러움으로 경험이 잘 공유되지 않을 뿐이다. 책 『환각』은 그렇게 감춰져 왔던 수많은 이들의 환각 경험에 관한 이야기다. 단, 이 책에선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환각은 부러 배제하고 대신 간질, 편두통, 약물 사용, 파킨슨병, 섬망 등과 관련된 환각에 집중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환각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일반적 경험인지 알 수 있으며, 우리는 나 자신이 경험했으나 한쪽으로 치워두었던 어떠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다.
올리버 색스는 평생 편두통에 시달렸으며 한때 약물중독을 경험했고 시각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경험한 환각의 편린도 함께 담겨있다. 그렇게 환각은 당사자에겐 ‘경험’된 ‘실재’였다. “환각의 힘은 1인칭 시점으로 설명할 때에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책은 그 힘을 발휘하는 책이다. 그가 경험한 편두통에 의한 환각, 약물중독에 의한 환각, 시각장애로 인한 환각(샤를보네증후군)은 모두 달랐으며, 그는 다채로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환각을 병리적 증상이 아닌 의식적 기원에 대한 물음으로 이끈다. ‘편두통이 일어나 발생하는 기하학적 무늬는 수만 년에 걸친 거의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혹시 내면에서 일어난 환각적 경험이 외부로 표출된 건 아닐까?’ 이러한 올리버 색스의 탐구가 예술, 민속, 종교의 발생에 대한 물음에까지 다다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다.
“도스토옙스키가 경험한 것과 같은 무아경 발작은 신이 존재한다는 느낌에 일조한 것이 아닐까? 유체이탈 체험 때문에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있다는 느낌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 환각의 비실재성이 유령과 혼령에 대한 믿음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는 환각성 약물을 찾고, 무엇보다 신성한 목적에 그것을 이용할까?” (『환각』, 8쪽)
이러한 이해는 어떠한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합리적 이성’이 작동하는 의식은 수많은 의식 중 그저 하나의 특수한 의식일 뿐이라고. 다만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에 가장 적합하기에 ‘정상’으로 택해졌을 뿐이라고. 그런데,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일시적으로 환각을 경험하는 이들은 어느 지점에 있는가. 이토록 진동하는 우리의 의식을 단 하나의 잣대에 묶어두어도 괜찮은가. 환각적 경험이 예술과 종교와 문화의 뿌리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를 ‘비정상’으로 치부한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또 다른 문화의 씨앗이 될 풍부한 자원을, 우리 삶을 풍요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실마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삶과 의식이 순환되는 연결고리 한 부분이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무언가 허하다.


좋은 날 보내세요. 저도 좋은 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