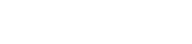시선 폭력'에 맞서, 꿋꿋이 서서 보란듯이 책을 읽었다
누구나 시선이 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아름답고 멋진 사람부터 개성이 넘치는 사람, '보통사람'보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까지 말이다. 장애인이라 불리는 나는 대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위치에서 시선을 받는다.
지하철을 타면 다른 사람보다 짧고 모양이 다른 나의 손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 하루에도 수 차례 이런 시선을 받는다. 사람들은 대게 내 손을 한번 보고 얼굴을 본 다음, 다시 손을 본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긴장시킨다.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데 어떤 중년 사람이 내 손을 쳐다보았다. 그 이는 내 손을 응시했고, 한 번 머문 시선은 힐끔거림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 이의 힐끔거림을 인지하고 그 사람의 눈을 응시했다. 그 사람은 시선을 거두었고 나도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을 거두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를 다시 응시했고 나는 그 이의 시선을 알아챘다.
"네 손은 신기하게 생겼네", "내 손이랑 다르다"
"내 손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도 자꾸 보고 싶은 걸 어떡하냐. 네 손이 신기하게 생겼으니..."
"자꾸 내 손을 쳐다보지 마세요"
일명 '눈짓대화'라고 이름 붙이면 터무니없는 이름짓기일까? 이미 나는 이 중년사람과 눈짓으로 대화를 하기 전에 다른 이의 시선이 따가워 자리를 이동해온 터였다. 자리를 잡고 앉았기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싫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그대로 힐끔거리는 눈을 견디며 앉아있기도 싫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중년 사람 앞으로 걸어갔다. 그 사람은 적잖이 당황했다. 내가 일어난 자리를 힐끔보고 본인의 양손을 맞대고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 이가 정면을 응시할 때, 그 이의 시선이 책을 쥔 나의 손과 일직선을 이루도록 책의 모서리를 손으로 받쳤다. 꿋꿋히 서서 보란듯이 책을 읽었다. 그 이는 결국 눈을 감았다가 뜨고, 또 떴다가 감았다.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난 후에 내 등 뒤 자리가 비자, 저 쪽에 자리가 났다고 친절히 말해주기도 했다.

사실 오늘 만난 사람은 전에 만났던 사람과 비교하면 양반이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인데, 나는 지하철을 타고 책을 보며 서있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책을 쥔 나의 손을 응시했다. 그래서 나도 그 이를 응시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내 눈을 피하지 않고 "왜?"라고 말했다. 무슨 이유로 나를 쳐다보냐는 말이다. "쳐다보셔서요." 꾹 참고 존대했다. "네 책 표지를 봤어"라고 그 사람은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의 눈을 응시하며 실소를 지었다.
내가 불쾌한 시선과 씨름하는 사람이다보니 다른 이들이 보내는 시선도 예사롭게 여겨지지 않는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동정의 눈'과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을 보는 '훑는 눈', 노숙인들을 보는 '혐오의 눈'까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시선이 불쾌하다. 그저께는 어떤 중년 남성이 내 앞에 서있는 중년 여성을 쭉~ 위 아래로 훑고 지나갔는데 다가가서 시비를 붙이고 싶었다. "도대체 왜 그런 눈으로 사람을 훑냐", "사람이 사람을 그런 눈으로 봐도 되냐"고 말이다.
요즘은 시선강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하루에 2시간 남짓 지하철을 타는 나는 이 말을 이해한다. 타인의 시선을 그러려니 수용하다가도, 가끔은 숨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쓰라리고 존재가 작아진다. 이쯤되면 시선이 폭력으로 여겨진다.
시선에도 차이가 있다. 가끔 어떤 중년 여성은 책을 쥔 내 손을 기특하게 쳐다본다. "그 손으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니 넌 참 기특하구나." 이런 생각은 내 망상일 수도 있으나 그냥 동물적인 감각이다. 그런데 그런 시선도 영 기분 나쁘다. 동정과 혐오는 연속 선상에 있고, 동정의 눈과 혐오의 눈은 결국 같기 때문이다.
힐끔거림이 없어지는 사회는 멀고 아득하다. 미래를 희망적으로 상상할 때나 어렴풋이 보인다. 언제까지 나는 출근길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며 '나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손을 가진 장애인이다. 힘을 내자 최재민'이라고 결의해야할까? 힐끔거림이 없는 사회가 내 생전에 오기나 할까? 나는 아득한 그날을 상상하며 시선폭력에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