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 권리구제율 ‘52.7%’… 인권위 강화 방안은?
“장애인 인권위원 2명 이상은 돼야”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도 필요

인권의 방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보수적 결정에 ‘비장애 법조인’ 중심의 인권위원 구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런 지적은 8일, 서울시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 2부에서 나왔다. 2부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 강화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앞서 진행된 1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 인권위원 11명 중 장애인 1명… 이대로 괜찮은가
장애계는 인권위원의 구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인권위원이 비장애 법조인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11명의 인권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는 서미화 위원 1명뿐이며, 법조인 출신은 송두환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이나 된다. 장애계는 이런 구성이 인권위가 법률의 틀에만 얽매여 인권의 관점에서 권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만큼, 장애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 인권위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권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권 전문가의 비중을 30%로 높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인권위 진정은 크게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과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으로 나뉘는데,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의 절반 가까이가 장애차별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인권위 전체 진정사건으로 보면 장애인차별사건은 10% 정도”라면서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다양한 유형의 차별사건이 늘어날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애계의 요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임 변호사는 2020년 인권위가 처리한 장애차별 진정 1350건 중 712건(52.7%)이 권리를 구제받은 사실을 두고도 권리구제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임 변호사와 다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인권위의 장애차별 권리구제율은 “50%를 겨우 넘은 것”이라며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잣대가 아닌 비장애인 중심적 사고로 판단한 것은 아닌가 의심할 만한 숫자”라고 힘줘 말했다.

명숙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심의 인권위원 구성이 보수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인권위는 법원 판결보다도 후퇴한 결정을 내놔 비판을 받곤 했다. 지난 2019년 인권위는 ‘멀티플렉스 3사(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는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영화관을 상대로 한 장애인들의 진정을 기각했다.
또한 2018년에는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바닥면적 기준을 기존의 300㎡(약 90평)에서 50㎡(약 15평)로 바꾸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바닥면적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에도, 기준을 그대로 남겨놓은 것이다. 지난 2월 법원이 바닥면적 기준 자체가 “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명숙 활동가는 “30%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권 전문가가 인권위원 중 적어도 2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인권조약 이행 위해서도 인권위 역할 중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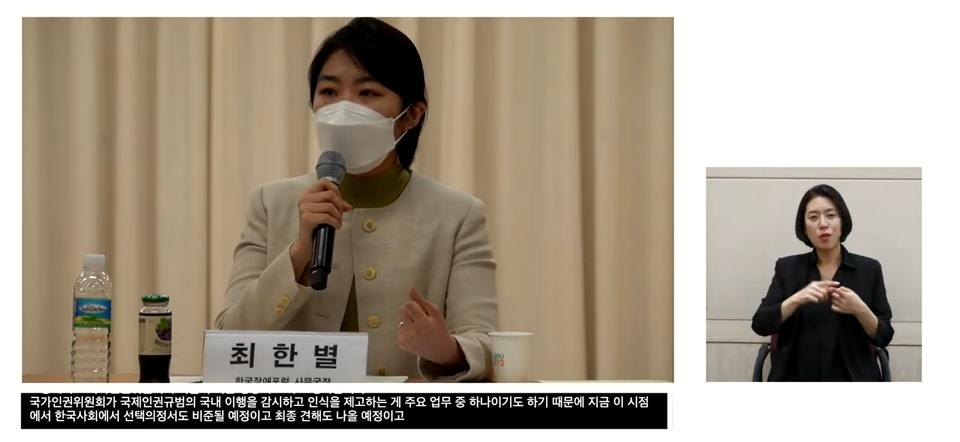
또 다른 토론자인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한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지금이 인권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아래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다가, 오는 8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현황을 심의하고 최종견해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협약의 선택의정서가 비준되면 위원회는 한국 정부를 직권조사해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위원회의 권고 이행 절차를 어떤 기구가 담당할지가 문제로 남는다. 현재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설치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에 산하 기구 설치 △인권위 담당이라는 3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사무국장은 “직권조사와 같은 메커니즘을 이용하기까지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인권적인 권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오직 인권 증진을 위해 세워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 기구’라는 점을 명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주문하며 “기존의 행정적, 사법적 문법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 소수자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인권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