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진짜로 고향이 서울인 사람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나에겐 저 짧은 대화만큼 우습게 들리는 이야기도 없다. 고향이라고 하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부뚜막 연기와 할머니의 옛날이야기' 같은 식의 추억까지는 아니어도, 친구들과 뛰어놀던 좁은 골목길의 추억쯤은 있어야 감히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고향’에 대한 현대인의 왜곡된 이미지의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서울이 ‘고향’다운 역할, 그러니까 사람들 인생의 흔적들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담아두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지 나는 항상 의심스러웠다.
자고 일어나면 주변 상가들의 간판이 바뀌어 있고, 하루가 멀다고 옛 건물들은 뜯겨나가고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들만이 더 넓게, 더 높이 쌓아 올려지고 있다. 심지어 계절 따라 구청에서 파견 보낸 인력들이 갈아엎어 심은 도심 공원의 나무와 풀에서는 인공적인 냄새마저 풍긴다. 이곳 서울엔 사람의 흔적, 사람의 냄새가 배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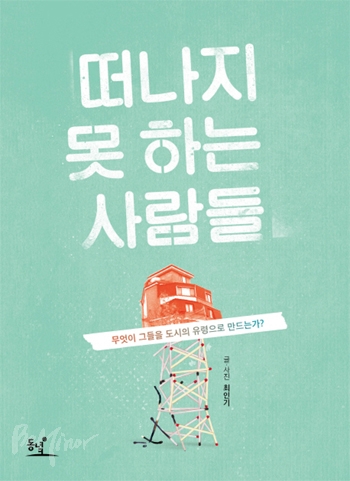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최인기 저, 동녘, 2014 |
20년 넘게 빈민운동 현장을 지켜온 최인기의 새 책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서울을 자신의 추억이 서린 ‘고향’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곳곳에 고통과 상처의 흔적들이 가득하지만, 그곳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서울 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다.
청계천 복원공사 때문에 좁은 골목 구석으로 떠밀린 종로구 창신동의 오래된 상가들,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에 의해 사실상 장사하며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종로거리의 노점상들, 부랑인·넝마주이라는 이유로 강제이주를 당해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강남구 포이동 사람들, 서울역 주변 커다란 건물 뒤에 가려 햇볕 한 줌 없이 살아가야 하는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 사람들….
저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내고 화려한 겉모습에 감춰진 불편한 공간을 다시 들춰내고 싶었다”라고 책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그는 “이러한 제 작은 시도가 소비적 욕망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모습과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모습이라는 도시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한다.
실로 그가 책 속에서 전해주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단지 ‘가난에 허덕이는’ 모습만은 아니었다. 한 사람 몸을 눕히고 나면 끝인 한 평 반 쪽방에 살지만, 동자동 주민들은 스스로 공제 협동조합을 만들어 서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소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청계천 복원공사에 의해 임시상가로 떠밀려 났지만 수십 년간 청계천 일대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담백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의 환경과 문화, 역사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멀쩡했던 마을이 파헤쳐지고 새로운 건물로 들어차”는 것과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박하고 정겨운 이미지를 덧씌우면서 슬며시 가난의 공간을 은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도시의 유령’이 되었다. 유령은 살아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셈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주민등록도 말소당해야 했고, 살기 위해 불안하게 쌓아올린 망루 위로 올라가야 했다. 그렇게 망루 위에 올라간 용산의 철거민 5명은 2009년 1월 20일 화염 속에 주검이 되어야 했다. 쪽방 거주자 또는 노숙인이 연고자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시신은 ‘합법적으로’ 의과대학 해부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도시의 시민이 아니라 ‘유령’이기 때문이다.
그 무수한 ‘유령’들이 서울이라는 황량한 도시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기록이 저자가 정성스럽게 찍은 사진들과 함께 한 권의 책에 담겼다. 이 책에 담긴 ‘도시 속 유령’들의 이야기는 절대 지워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더 이상 ‘유령’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절규이기 때문이다. (동녘, 정가 1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