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역사가 되어버린 사람들 ③
아동보호소서 9년, 형제원서 11년 수용된 김세근 씨
이름 쓰는 법도 안 알려주고 ‘복지’만 운운하는 국가
마음의 짐 덜어내려면 “대통령 진심 어린 사과부터”
삶 자체가 시설 수용의 역사인 사람들이 있다. 언론에 잘 알려진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외에도 시설에 끌려간 이들의 삶에는 지금도 국가폭력의 그림자가 깊숙이 배어 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5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불법적으로 이뤄진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비마이너는 시설이라는 굴레에 지독하게 내몰렸던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연재한다. 세 번째 순서는 20년 동안 시설에서 당한 폭력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김세근(65) 씨 이야기다.

“숱하게 깨지고 맞았습니다. 턱이 내리 찢어지고, 코뼈가 돌아가고, 무릎은 부서지고, 머리는 100군데 넘게 꿰맸습니다. 1962년부터 시설에 갇혀 살다가 1982년에 도망쳐 나왔으니, 두들겨 맞은 세월만 20년이네요.
6살 때 고모님하고 창경원(창경궁)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서울시청 아동과에서 나온 사람이 경비실에 맡겨진 저를 서울시립아동보호소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9년을 살았습니다. 4~5평짜리 방 한 칸에서 30~40명이 생활하는데, 어디 도망 못 가게 홀딱 벗겨서 칼잠을 재웁니다. 8살 되는 해에는 ‘양동빨대’라고 불리는 통장한테 곡괭이자루로 맞아 엉덩이 살갗이 다 찢어졌습니다.
삼각산(북한산) 담벼락에 가 보면 퍼어런 시체 창고가 있습니다. 친구 한 놈이 도망가다 양동빨대한테 걸려서 맞아 죽었는데, 제가 그 시체를 군용 담요로 돌돌 말아서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병원에서 가지러 와요. 일주일에 3~4구씩 실려 나갔습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 운영된 서울 은평구의 부랑아 수용시설이다. 김세근 씨는 그곳에서 보고 들은 장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기억한다. 창살 달린 창문, 가림막 없는 화장실, 벤졸로 하얗게 뒤덮인 피부, 열중쉬어 구령이 울려 퍼지는 운동장. 그의 몸과 마음을 관통하는 단어는 ‘폭력’이다. 그는 ‘히로시마’ ‘고춧가루’ ‘원산폭격’ 같은 단체 기합을 받던 당시 상황을 재연배우마냥 생생하게 묘사해 보였다. 폭력의 기억은 지금도 온몸에 달라붙어 그의 삶을 송두리째 옥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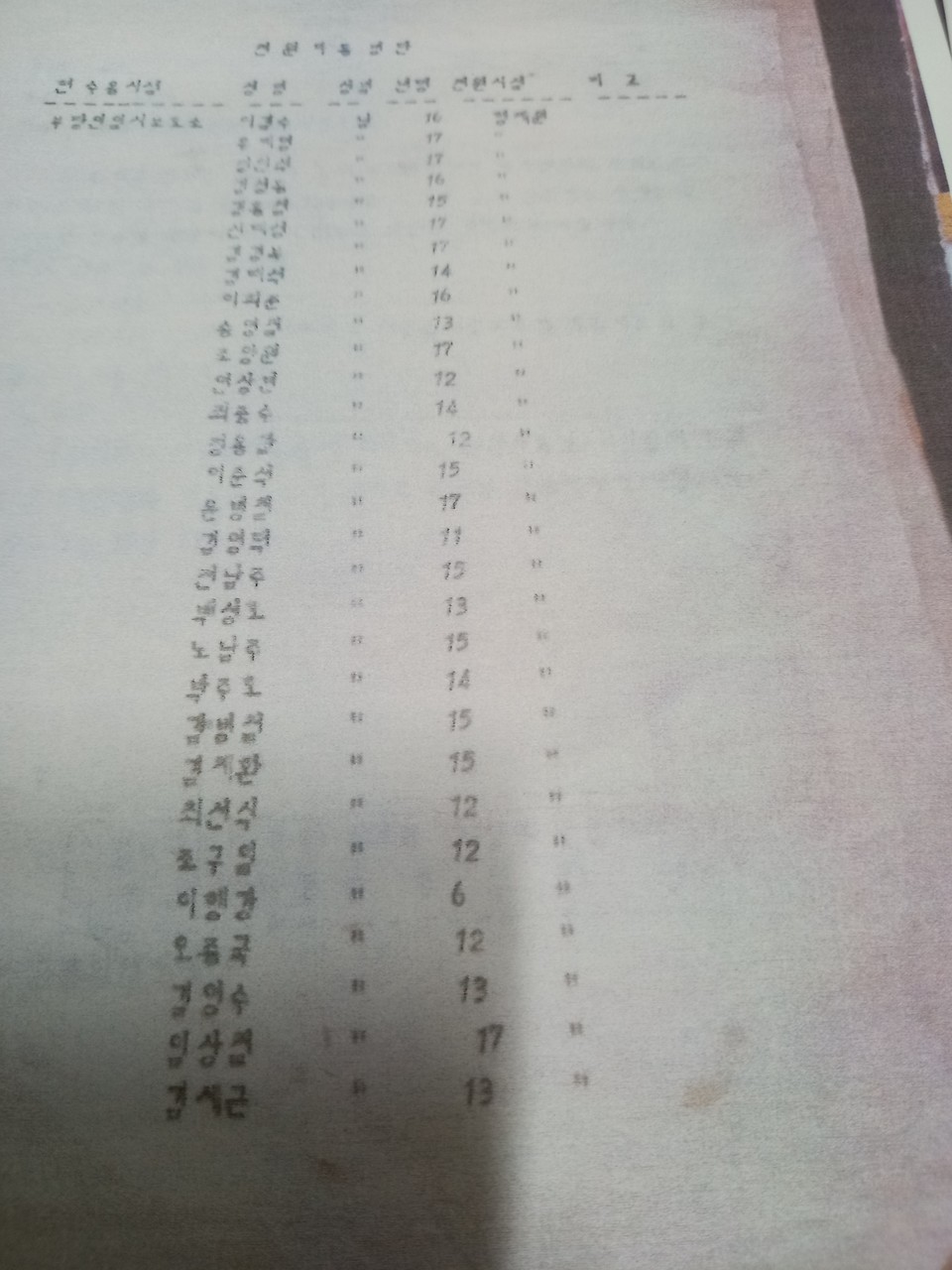
“1971년에 탈출하자마자 공안 경찰한테 붙잡혀 용당동 형제원에 끌려갔습니다. 5년 뒤에 주례동으로 형제원이 옮겨졌는데, 그때 돌 나르고 축대 쌓으며 1층짜리 소대 12개를 지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서울시립아동보호소가, 육체적인 고통은 형제원이 심했지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1,800명이었는데, 그 뒤로 3,800명까지 입소했다고 들었습니다.
형제원 있을 적에 눈이 찔려서 망막이 벗겨지고 피도 나고 그랬는데, 최근에 시력 장애가 와서 안과에 가 보니 시신경이 전부 말라 비틀어 죽었답니다. 고지혈증 약, 시신경 약, 척추 약을 복용 중입니다. 공황장애랑 폐소공포증 때문에 정신과 약 먹은 지는 30년 정도 됐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4~5번씩 시설에서 두들겨 맞는 꿈을 꿉니다.
그동안 인터뷰해도 부끄러워서 말 못 했는데, (바지를 내려 보이며) 아직도 이렇게 두꺼운 똥 기저귀를 차고 다닙니다. 동성 간 성폭력을 당해서 항문이 파열됐어요. 기저귀 안 차면 한 번씩 무른 변이 나오는 실수를 합니다. 이런 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몇천만 원을 준다 해도 말 못 할 일이지요.”
자동차 정비, 보일러 시공, 인테리어 도배, 건축 도장, 한식 조리, 제과제빵, 귀금속 공예. 시설을 나와 어떻게든 나아진 삶을 살아보려고 자격증만 7개를 땄다. 그러나 장애와 질병이 심해져 일 자체를 포기해야 했다. 기초생활 수급비로 받는 월 58만 원의 생계급여를 제외하면 국가와 제도는 단 한 번도 그를 지켜주지 않았다.

“몸이 이 모양인데 국가는 복지, 복지 떠들기만 해요. 58만 원으로 한 달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휴대폰 요금 내야지, 전기세랑 가스비 내야지, 하다못해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으려 해도 구제품 살 돈밖에 없지. 고기 구경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다고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줬나요. 말로만 무상교육이지 20년 넘게 이름 쓰는 법도 안 알려줬습니다. 한번은 서면에 있는 돌고래다방 바로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기 돌고래다방이 어딥니까’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간판에 적힌 글자를 못 읽었습니다. 지금도 글 쓴 거 보면 받침은 많이 틀려요.
평생을 어두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전 국민이 다 들을 수 있게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도, 안 좋았던 시선도 사라질 테고 긍정적으로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과 한마디에 응어리가 다 풀리지는 않겠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살아갈 순 있지 않겠습니까.”
<시리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