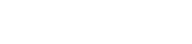노들야학서 느낀 ‘이상한 기쁨’
“대학 안 가도 시 쓸 수 있구나”
동료의 제안 ‘언니, 죽기 전에 시집 한 권 내자’
차별의 통증, 그럼에도 사랑하고 싶은 세상

- 노들야학서 느낀 이상한 기쁨 “대학 안 가도 시 쓸 수 있구나”
정숙은 “은둔 시인”이 됐다. 혼자 쓰는 다음 카페에 시를 올렸다. 그렇게 쓴 시가 700편이 넘는다. 시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술과 노래방 말고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시를 배우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러려면 검정고시부터 봐야 했다.
2012년, 인터넷에 ‘장애인 야학’을 검색했다. 대학로에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아래 노들야학)이 나왔다. 집에서도 가까웠다. 전화를 걸었더니 한명희 교사가 받았다. “언니, 무조건 오세요.”
노들야학은 낯선 곳이었다. 비장애인 속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정숙은 이렇게 많은 장애인이 모여 있는 건 처음 봤다. 이상하고 기쁜 일이 자꾸 일어났다. 사람들이 식당을 찾는데 휠체어 이용자가 갈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다. 겪어본 적 없는 일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았다.
“일고여덟 명이 밥 먹으러 가는데 식당이 정해져 있었어요. 우연히 나를 딱 만난 거야. ‘언니도 같이 먹고 갈래?’ ‘나 가도 돼?’ ‘그럼!’ 그 자리에서 의논해서 계단 없는 식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무 미안했죠. ‘안 바꿔도 돼. 나 갈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너무 이상한 거야. 겪어보지 않은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 뭐지? 너무 기뻤어요. ‘진짜 나’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노들야학에 있는 11년 동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게 가능하구나. 근데 왜 이 사회는 안 되지? 할 수 있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히는 이상한 기쁨을 느꼈어요.”
노들야학에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땄다. 대학은 안 가기로 결정했다. 안 가도 시를 쓸 수 있단 걸 알았기 때문이다.
“굳이 대학에 안 가도 되겠더라고. 대학 졸업장 따서, 학력으로 줄세우기 하는 사람들한테 맞서고 싶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차별받고 투쟁하는 장애인의 삶, 고통받는 내 삶 자체가 시라는 걸 노들야학에서 알았거든요. 대학에 안 가도 시를 쓸 수 있었으니까.”
- 언니, 죽기 전에 시집 한 권 내자
시집을 내자고 제안한 건 김종환 장애해방열사_단 활동가다. 종환은 정숙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숙언니 글은 말할 수 없는 느낌이 있어. 달라. 시 쓰는 많은 장애인이 책을 못 내고 죽어. 너무 아까워. 언니, 죽기 전에 시집 한 권 내자.’ 종환과 매주 토요일에 만나 700편 중 시집에 실을 작품을 추렸다. 띄어쓰기나 맞춤법 틀린 부분도 손봤다.
정숙이 안 하겠다고 엎었다. 자비로 출판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집을 내는 건 사치스러운 일 같았다. 시집 낼 돈을 노들야학에 기부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화가 난 종환은 정숙과 한 달 동안 대화를 안 했다고 한다.
시집을 다시 내야겠다고 결심한 건 한광주 장애학연구자의 논문 덕분이었다. 한광주는 논문을 쓰기 위해 정숙을 인터뷰한 적 있다. 논문에는 정숙의 인생과 시에 대한 해석이 적혀 있었다. 정숙은 “그래, 시집을 내는 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결심은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돈이었다. 종환이 펀딩을 받자고 제안했다.
“펀딩하자.”
“싫어. 나는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 활동가들 조그마한 활동비 받아가지고 어렵게 사는 거 다 아는데. 민폐야.”
“언니한테 김밥 얻어먹은 사람이 얼만데? (정숙의 남편은 매일 정숙에게 김밥을 싸준다. 정숙은 매일 활동가들에게 나눠 준다. 정말 맛있다.) 김밥 먹은 사람들은 전부 펀딩하라 그래!”
펀딩을 위한 팀이 결성됐다. 노들야학 교사인 서한영교, 정숙과 함께 사단법인 노란들판에서 일하는 허신행이 힘을 합쳤다. 펀딩은 성공했다. 80명이 〈통증일기〉를 읽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출판에 필요한 돈이 만들어졌다. 종환의 출간제안부터 시집이 나오기까지 2년이 걸렸다.
“너무 감사하죠. 나를 생각해 주는 든든한 독자이자 동지가 80명이 있는 거야. 요즘은 이 감동에 살아요. (웃음)”

- 타인의 통증도 내 것이 되는
시집을 낸 후 ‘정숙아, 네가 그렇게 아픈지 몰랐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제목만 보면 아픔에 대한 시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가족과 맛있는 족발을 먹었을 때의 행복(〈어느 날 저녁〉), 잊고 산 인연에 대한 감사(〈건망증 편지〉), 남편에 대한 사랑(〈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찬(〈너로 인해〉)도 담겨 있다.
그런데 왜 제목은 「통증일기」일까. 정숙은 “시간의 모든 것은 통증”이라고 말한다.
“섬유근육통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프지만 그것만 통증인 건 아니에요. 찬란한 햇빛 같은 통증도 있어요. 너무 기쁜데 눈물 나는 순간 있잖아요. 노들야학에서 느낀 이상한 기쁨도 나를 자극하는 통증이고요. 저한텐 다 통증으로 와요. 통증을 견디려고 시를 써요.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내가 이렇게 좋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통증을 시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통증도 정숙에게 온다. 홈리스(〈나는 지금 아프다〉, 〈빌딩 그림자 속의 숨은 그림〉), 노점상(〈마르지 않을 눈물〉), 반지하 폭우 참사 피해자(〈폭우〉), 농민(〈농부님께 구하는 용서〉), 성폭력을 겪은 발달장애인(〈피눈물〉), 세월호 참사 피해자(〈봄이로되〉), 철거민(〈상도동 159번지 2003년 겨울〉), 성노동자(〈빨간 입술 텍사스 그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오월아〉) 등 고통받는 사람들의 통증도 시에 담겼다.
이들의 통증을 깊게 파고들기도 한다. 누군가 부당하게 목숨을 잃으면 한없이 뉴스를 들여다본다. 기꺼이 목격자가 된다. 그의 통증이 나의 통증이 돼야만 한다. 기어이 눈물을 흘려야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에 계속 분노가 나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자꾸 우니까 우리 남편이 못 보게 해요. 그래도 나는 일부러 뉴스를 찾아봐요. 그 아픔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봐요. 그래야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에 내가 들어가서, 내 눈물로 떨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파요.”
너무 힘들진 않냐는 질문에 정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보고 힘들어야 해요. 어떨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머리맡에 놔둔 메모지에 한 줄 딱 써 놓을 때도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 매일 쓰는 일기이자 시, 시인 박정숙이 눈에 담은 것들
목격자 정숙은 뉴스만 보지 않는다. 일상의 액자에 담긴 장면을 들여다보고 시에 담는다. 그래서인지 정숙의 시는 회화적이다. 자신과 타인의 삶에서 길어 올린 낱장의 기억은 정숙의 시각을 통과한 것들이다.
대학로에 40년 살면서 본 마로니에 공원도 매일이 다르다. 구름과 꽃도 보지만 가난한 사람을 본다. 낙엽이 흩날릴 만큼 매서운 바람이 부는 성탄절에도 마로니에 공원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홈리스를 본다.
공원 한 켠 오래된 정물처럼
길게 누운 그는
처음부터 거기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다
(…)
틈새 사이사이 차고앉은 어둠
꼬깃꼬깃 숨겨둔 자존심 한 뼘의 눈물
- 〈나는 지금 아프다〉
인정 없는 뒷골목엔 매몰찬 바람만
구유도 없이 늙어가는 가난을 후려
폭식하고 겨우 남긴
낡은 구두 한 짝, 쓰레기통에 처박는다
부서진 낙엽을 모아 올리며
조롱하는 너,
메리 크리스마스
- 〈대학로 노숙 예수〉
“민지쌤이 나한테 ‘보는 사람 같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40년을 넘게 이 동네에 살았지만 매일이 달라요. 구름의 모양이 다르고, 피는 꽃이 다르고,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달라요. 어떤 날은 아침 7시에 컵라면을 먹는 사람을 보기도 해요. 옛날에는 마로니에 공원에 홈리스가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투쟁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지나다니면서 뭔가를 보면, 통증일기라는 큰 제목을 갖고 매일 시를 써요.”

- 통증의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
「통증일기」에는 정숙의 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시도 여러 편 실려 있다. 정숙은 “너무 아플 땐 기도문 쓰듯이 시를 써요”라고 말했다.
이 시집의 마지막 작품이자 유일한 산문시 〈통증일기〉에는 “기도할 수 있어서 나는 죽지 않았다 차별적인 사회의 요구를 거부했기에 나는 나로서 살아남았다”는 구절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생존의 필요조건으로 신앙과 투쟁이 동시에 적혔다는 것이다.
신앙과 투쟁은 정숙이 세상을 껴안고 사랑하려는 이유다. 가난이 마시라 했던 농약을 뒤로하고, 젊은 날 겪은 여러 겹의 차별을 거부하고, 정숙은 살아남아 노년을 향해 간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신앙의 증거이며, 살아남아 투쟁하는 것이 통증의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이유다.
“옛날에는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 장애인으로 살게 하려면 돈 많은 부모를 주든지, 학교에 다니게 해주든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장애인으로 살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은 고난과 차별을 겪고도 지금 살아있는 게 신앙의 증거라고.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껴안아야죠. 이 세상은 나를 밀어내지만 동무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사랑해야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서 살아 봐’ 하고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했으니까.”
정숙은 죽는 순간까지 통증일기를 쓸 거라고 했다. 시집을 더 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어요. 책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라고 대답했다.
독자를 향해서는 “내가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고 느낀 걸 많이 썼어요. 시집을 사면 한두 페이지 읽고 안 읽게 되기도 하잖아요. 「통증일기」는 읽어봐 주세요. 나한테 ‘넌 왜 맨날 웃고 다녀?’ 하는 사람들, 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읽어 주세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