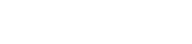최인기의 두 개의 시선
최정환 열사의 죽음, 장애인운동의 초석이 되다

어려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고아처럼 살았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삼륜오토바이에 좌판을 설치해 카세트테이프를 파는 노점상이었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장사를 했을 테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삶의 기회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무나도 가혹한 단속과 멸시에 시달리게 됩니다. 연일 단속으로 지쳐 있던 이 장애인 노점상은 결국 자신의 몸에 차가운 기름을 끼얹고 서초구청 앞에서 분신합니다.
1995년. 조심스럽게 봄을 알리는 꽃 소식으로 충만할 즈음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이날 분신한 장애인의 이름은 38세의 최정환이었습니다. 3월 21일 오전 1시 50분경 마침내 최정환 열사는 운명했습니다. "4백만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복수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수천 명의 장애인과 노점상, 도시빈민, 학생, 노동자들이 종묘공원과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연세대에 모여 항의를 전개하게 됩니다. 은폐되어 있던 장애인 노점상 등 가난한 이들의 문제가 화염병과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김영삼 정부에 맞서 대대적인 대중투쟁이 전개됩니다.
이제 오래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로수의 잎 연두색으로 싹이 틀 즈음 그의 운명은 낙엽처럼 떨어졌지만 그 후로 최정환 열사의 죽음은 장애인운동의 초석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자신을 희생한 사람의 피를 보고서야 이렇게 찬란한 봄날을 서럽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